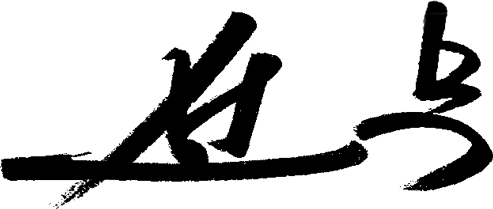이번 전시에서 선무는 새롭게 설치작업을 시도한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선무의 작업들은 작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작업들이었다. 때로 떠나온 곳에 대한 그리운 회상이었고, 때론 뼈아픈 질문이었다. 자신의 아픈 과거와 대면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른 이념의 사회, 다른 미술의 언어와 태도들 속에서, 그가 처음 수행한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었다. 지난 수년간 그는 그 과정을 꿋꿋이 지속해 왔다. ‘좌우지간’ 말이다. 그 그림 중 하나에 대해 나는 이런 질문을 했었다. “이 그림은 북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돌아온 답은 이랬다. “아니요.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어쩐지 부끄러웠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남과 북, 마주한 두 사회의 대결구도로, 누가 옳은지 겨루는 시선으로 그의 작업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은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한 오해라기보다는 편협하고 조급하게 다그쳐 묻는 추문(推問)에 가까왔으리라. 그는 오히려 덤덤했다. 그런 엇갈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

그간 그의 작업에는 주체미술의 조형적 특성과 내용들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 그림들은 그가 과거에 주체미술의 안에서 그려낸 그림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결코 같은 그림일 수는 없다.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곳으로 되돌아간다 해도, 그는 여전히 과거의 ‘자기의 밖에 있으며’ (exsistere) 자신과 거리를 두게 되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얘기같아 보이지만, ‘찬양이냐, 비판이냐’라는 식의 다그침을 비롯한 여러 오해들은 사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심사숙고 해보면 좁혀질 수 있는 엇갈림들이 아니었을까 싶다. 현재의 그는 과거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그 둘의 동일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자기 성찰의 본질적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여기 있음은 ‘아직 아님’, ‘아직 있지 않음’의 미완의 형태로 반성적 지평 위에 존립한다. 그의 작업은 이러한 반성적 지평 위에 소환되고, 부정되고, 해체되고, 새롭게 통일되기를 반복해왔다.

이번 선무의 작업에서는 그간의 길었던 자신과의 대화가 세계와의 대화로 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설치계획을 보면, 이번 작업에서 그는 현재 자기 앞에 펼쳐진 세계의 벽과 모순에 대한 직설적이고 과감한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과거는 자신을 넘어가 현재로, 미래로 이어질 것을 요구한다. 고통스런 회상과 성찰은 과정일 뿐 결코 자신을 절대화할 수 없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금 여기를 향해 말하기 시작한다. 고통이여 ‘좌우지간’ 사라져라! ● 눈 앞의 현실을 향해 발언할 때 자기 앞에 서있는 수많은 ‘너’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동시에, 나 역시 그 수많은 ‘너’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다른 이념과 다른 고통들,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미술의 언어들 사이에서, 너와의 적극적인 대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신의 개별적 주체성을 고민해야만 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을 품고서 자기 현재의 지평을 열고자 세상에 부딪히는 작가의 진실과 용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 어조와 수사는 시간과 함께 변화하고 자기 발전 과정을 겪게 되겠지만, 이 열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 藝術基地 땅굴